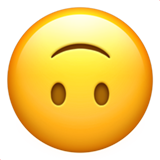[1장] 우리 뇌는 아직도 수렵 채집인이다.
- 우리가 인터넷과 함께 산 것은 인류 역사 중 너무 짧은 기간
- 20만 년 전 동아프리카에서 인류의 탄생 후 만 세대가 있었다면,
- 그 중 9,500세대를 수렵 채집인으로 살았고,
- 그 중 자동차, 전기, 깨끗한 물, TV가 있는 세대에 산 인류는 8세대
- 그 중 컴퓨터, 휴대전화, 비행기가 있는 세상에 산 인류는 3세대
- 그 중 스마트폰, 페이스북, 인터넷이 있는 세상에 산 인류는 1세대
- 우리는 오늘날 세계에 맞추어 진화하지 못함
- 신체적인 부분
- 과거: 인간의 15~20%가 굶어 죽었기 때문에 먹는 다는 것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
- → 많이 먹던 사람이 살아남았고, 유전적 특질로 남게 됨
- 현재: 비만과 2형 당뇨는 세계적인 문제
- 정신적인 부분
- 과거: 자연에서 살아남았어야 함
- → 불안과 대비가 생존 가능성을 높였고, 유전적 특질로 남게 됨
- 현재: 안전한 세계에 살아도 끊임없이 사고를 대비하느라 불안과 공포증에 사로잡힘 (심한 경우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 ADHD)
- 감정적인 부분
-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, 뇌는 즉각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분비 → 심장이 빠르고 강하게 뜀 → 신체의 근육에 더 많은 피를 내보내 달아나거나 반격하도록 만듬
- 긍정적인 감정보다 부정적인 감정이 우세함
- 역사적으로 위협과 연관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대처해야 했기 때문
-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
- ⇒ 감정도 생존 전략: 유연하고 빠르게,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함
- 신체적인 부분
[2장] 우울증은 뇌의 보호 전략
- 스트레스는 HPA축(시상하부·뇌하수체·부신축) 시스템과 관련됨
- 투쟁-도피 반응(Fight or Flight Response)
- 시상하부 → 뇌하수체로 신호 → 부신에서 코르티솔 호르몬 분비 요청 → 에너지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심장을 빠르고 강하게 뛰게 함
- 트러블 슛 모드: 위험에 즉각적으로 대처영향 2.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, 뇌의 기억 저장소인 해마(hippocampus)가 새로 형성된 기억 회로에 신호를 보낼 겨를이 없어지고 기억력이 감퇴하게 됨
- 영향 1. 취침, 음식, 번식 등을 나중으로 미루고 스트레스에 대하여 빠르게 결정을 내리고 싶어함 →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게 됨
- 하지만, 단기간의 스트레스는 집중력을 높이고 사고 기능을 예리하게 만듬 (HPA축이 제거된 실험동물은 만사에 심드렁하고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어졌음)
- 투쟁-도피 반응(Fight or Flight Response)
- 편도체(amygdala)
- 위험을 탐색하고 발견하는 즉시 HPA축을 작동시킴
- 사자를 떠올리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달아나는 사람이 생존할 확률이 높았을 것이므로, HPA축을 작동시키는 과정은 빠르게 일어나지만 정확성은 떨어짐
- 이론적으로는 모든 것이 편도체 활동을 가속시킬 수 있음 (담배나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운전하는 등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진화의 관점에서 적응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)
- 위험을 탐색하고 발견하는 즉시 HPA축을 작동시킴
- 우울증
- 우리는 더 오래 살고, 더 건강하며, 어느때보다 연결이 되어있는 시대에 살고있음에도 더 우울해 보임 (스웨덴 성인 9/10이 항우울제를 처방받고 있음
- 장기적인 스트레스 → 우울증
- 뇌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곳곳에 위험이 산재해 있다고 해석하며, 숨어있는 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 (우울감을 느끼게 하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).
- 우리의 선조들은 육식동물이나 자신을 때려죽이려는 다른 사람들, 굶주림, 감염병 등을 맞닥뜨렸을 때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을 활성화하고, 그 자리에서 도망치는 것이 도움이 되었기 때문
- 우을증에 걸릴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유전가의 두 가지 임무
- 면역 체계 활성화
- 위험, 부상, 감염으로부터 몸을 사림 → 우울감을 느끼게 하여 목적을 달성하게 됨
- 뇌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곳곳에 위험이 산재해 있다고 해석하며, 숨어있는 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 (우울감을 느끼게 하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).
결론: 불안이 위험에서 우리를 구하고 우울증이 감염증과 다툼에서 우리를 지켜준다. ‘우울한 건 내 잘못이 아닌, 내 뇌가 지금 내가 사는 곳과 다른 세계에 맞춰진 행동을 하고 있을 뿐’
[3장] 몸이 되어버린 신종 모르핀, 휴대전화
- 스마트폰으로 인한 도파민 분비
- 도파민의 가장 중요한 임무: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선택하게 만드는 것 → 우리 몸의 엔진
- 주변 환경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생존 확률이 높았을 것임 → 도파민이 새로운 정보를 찾아 헤매게 하는 본능을 이끌어 냄
- ⇒ 컴퓨터와 휴대전화로 매번 새로운 페이지를 볼 때마다 뇌는 도파민을 분비하며, 그 결과 클릭을 거듭하게 됨
- 예측 불허인 것에 더 끌린다
- 예측불허일 때 도파민이 더 많이 분비됨 → 이유가 명백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도파민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동기 부여이기 때문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함
- 쥐가 지렛대를 누르면 음식이 나오는 실험 → 30~70%의 확률로 음식이 나올 때 가장 절박하게 누름
- 벨소리를 들려주고 착즙 주스를 주는 원숭이 실험 → 벨소리를 들려준 이후 두 번에 한 번 꼴로 주스를 제공할 때 도파민이 가장 높았음
- 인간 대상으로 진행한 뽑은 카드에 따라 돈을 받는 실험 → 항상 돈을 받을 수 있을 때보다,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할 때 도파민 수치가 훨씬 더 높았음
- *경쟁 지향적이고 자존감이 낮으며 자신을 스트레스에 지나치케 많이 노출하는 A 유형 성격의 사람들이 삶에 편안하고 느긋한 태도를 취하는 B 유형 성격의 사람들보다 휴대전화에 의존적이었다.
- 예측불허일 때 도파민이 더 많이 분비됨 → 이유가 명백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도파민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동기 부여이기 때문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함
[4장] 집중력을 빼앗긴 시대, 똑똑한 뇌 사용법
- 디지털 생활 방식: 멀티태스킹을 하는 사람
- 집중력이 더 낮음
-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걸러내는 실험에서 제대로 필터링을 하지 못 함
- 일련의 철자들을 암기해야 하는 실험에서도 기억력이 떨어졌음
- 집중력은 아주 제한됨
- 우리의 정신적 대역폭에서 심각하게 제한을 받는 영역이 바로 집중력이다. 오로지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할 수 있음
- 주의 잔류물(attention residue): 뇌는 하나의 작업에서 다른 작업으로 넘어갈 때 전환기가 있는데, 넘어간 다음 작업으로 주의력이 바로 따라오지 못하고 조금 전까지 하던 일에 여전히 남아 있게 됨
- 멀티태스킹을 하면 작업 기억(working memory) 또한 약화됨.
- 심지어 무음상태일 때도, 그저 가지고 있을 때만으로도 주의가 분산되었다 (무시하기 위해 정신적 대역폭이 사용되기 때문에).
- 하지만, 멀티태스킹이 도파민을 분비(보상 제공)
- 선조들이 주변의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자극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항상 주변을 경계해야 했기 때문
- 집중력은 장기 기억 형성에 영향
- 기억이 오랫동안 지속되려면 ‘강화(consolidation)’ 과정을 거침
- 우리가 뭔가에 집중하면서 뇌에 “이게 중요해”라고 에너지를 쏟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함
- 작업 기억에 정보를 담아둠
- 기억이 오랫동안 지속되려면 ‘강화(consolidation)’ 과정을 거침
- cf. 멀티태스킹은 기억을 잘못 저장한다.
- TV를 보면서 책을 읽는 등 여러가지 일을 동시에 하면 정보는 대부분 선조체로 보내진다.
- 해마(기억의 저장호): 사실과 경험을 처리
- 선조체(striatum): 체득하는 내용을 처리
- TV를 보면서 책을 읽는 등 여러가지 일을 동시에 하면 정보는 대부분 선조체로 보내진다.
'쉽지 않은 인생기록 > 책책책을 읽자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보도 섀퍼의 돈 - 독후감 (1) | 2024.05.19 |
|---|---|
| 회계 천재가 된 홍대리 - 독후감 (1) | 2024.04.26 |
| 독후감 - 일 잘하는 사람이 반드시 쓰는 글 습관 (1) | 2024.03.16 |
| 린 분석 [Part 1-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기] - 독후감 (0) | 2023.08.28 |
| 프로덕트 매니저는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- 독후감 (1) | 2023.04.23 |